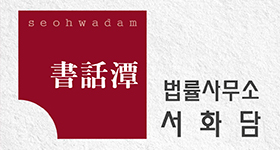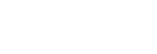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저희 주민들은,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진1리 주민의 간곡한 호소다.
지난 금요일(6월 21일) KBS 추적 60분에 보도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폐기물 고형연료(SRF)를 소각하는 발전소 옆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배출되는 악취, 연기와 분진, 소음으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대진1리에 들어선 후 지난 6년 동안 마을주민 200여 명 중 2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3곳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돈은 영리기업이 벌어가고, 사후관리는 국민 세금으로 하게 되는 부정의 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민 세금 100억 원 가까이를 들여서 복구했으나, 지금도 염소, 페놀 등 유해물질들이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주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더 투입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 성주군의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국비와 지방비 각각 23억 5천만 원 총 47억 원을 들여, 매립 후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침출수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당진시에도 업체의 부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떠맡은 매립장들이 있다.
산업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이나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청정지역에도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한탄강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도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곳곳의 농촌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유해 재활용시설(SRF 소각시설, 납 2차 제련공장 등)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성명에서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백, 수천억 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태영 그룹, SK, 태영과 손잡은 외국계 사모펀드인 KKR 등이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큰 손’이 되고 있다. 또한 온갖 편법과 특혜의혹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예도 있다.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승소했는데도, 업체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제안을 수용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를 쉽게 받으려고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일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과 ESG를 내세우는 SK그룹의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는 충남에서만 5곳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에선 친환경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농촌에서는 환경 파괴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생활폐기물은 공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구조이고, 주민감시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아니다.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마땅함에도 영리 업체들에 내맡기고 있고, 주민감시도 보장되지 않는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서 어느 한 곳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의 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가 맡아야 한다. 이윤만 추구하는 영리 업체들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신규로 매립장, 소각장, 유해 재활용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설치와 운영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자기 권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폐기물의 양도 줄여나갈 수 있다. 셋째, 기존에 들어선 산업폐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권을 최소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으로 보장하고, 기존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을 각 정당들에 이미 한 바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정·관·민 합동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산업폐기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추적60분의 마지막 클로징처럼 쓰레기는 정의를 모른다. 정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